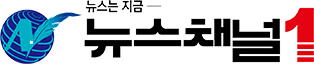물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 있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 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오래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화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 화가는 잠간 목례를 하고 하얀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다. 고요와 정적이 함께 흐느는 화실 안에서 화가의 붓은 전 후 좌 우, 위와 아래 그리고 깊고 낮음의 변화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화가의 이마엔 땀이 흐르고 보는 내 가슴엔 그 붓의 움직임이 한 편의 시를 쓰는 듯 했다. 그 화가의 그림 그리기는 한 편의 시쓰기라고 할까.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분은 정말로 그림 못지않게 여러 권의 시집을 낸 것을 알게 되었다.그 분은 바로 새와 금강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 화가이면서 시인인 정명희 선생님이시다. 아마도 그림 그리는 것을 말 없는 시라고 한다면 시는 말 하는 그림이라고 하면 맞을까. 어쨌든 시와 그림은 어떤 의미에서 한 꼭지점에서 함께 만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종삼 시인의 묵화는 6행으로 끝나는 짧은 시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시어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펼쳐저 있지 않지만 단아함속에 감춰진 이야기들이 옷고름을 풀면 술술 쏟아질 듯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 있다.-- 이는 분명히 두 줄의 시인데 한 장의 그림이 저절로 그려진다. 평화로운 시골 마당 한 쪽에서
평화롭게 물을 먹는 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어이구 내새끼, 잘 먹고 잘 크거라--라고 하는 할머니의 말,그리고 --밭 가느라고 혼났지? 잘 먹고 푹 쉬거라,-- 하며 예쁘게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한 장면이 연상된다고 할까? 같은 시어라고 하더라도 쓴 사람조차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시들이 많아 어렵듯이, 언어를 가지고 난해한 춤을 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어떤 시인은 시는 내면에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했다. 이는 시를 읽는 순간 마음속에 이미 변화가 일기시작하고 그림이 그려지고 잠자고 있던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음속에 감정이 꿈틀거리고 흥이 좋은 사람은 춤도 춰보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한다.시가 주는 내면의 변화가 외부까지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까. 그러나 시는 끝까지 조용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한다. 읽는 사람에 따라 속도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 모두에게 영원한 동반자이다.(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