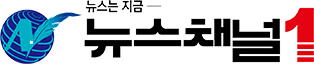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고 새로운 마음으로 보람찬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과연 살아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가끔 윤동주의 서시를 작은 소리로 낭송해본다. 그것은 시가 쉽고 비교적 짧아서 외우기 좋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자신을 다시 한 번 되 돌아 보게 되고 그러다보면 어쩐지 한두 가지 걸리는 일이 있어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바르게 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다. 대체로 완벽할 수 없다는 핑계로 수많은 오류와 잘 못을 저지르고 반성하고 고치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고 얼굴이 철면피를 깔 정도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특히 특정 분야에 몸담아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다.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더 그렇다하니 이럴 때 조용히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 본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교무부장이 교장과 한 바탕 하고 왔다며 교무실에서 식식거리고 있기에 난 평소 즐겨 읽던 법정 스님의 책 중 하나를 골라 중요부분에 밑줄을 그어 조용히 그에게 건넸다. 누가 잘잘 못을 따지기보다는 이 구절 한 번 읽고 마음을 가다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을에 또 한 번 불미스런 일이 있어 그 사람에게 또 한 권의 책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전에 자기가 치받던 그 자리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얼마 전 아랫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조금 지적했더니 자기에게 대들더라고. 그 순간 전에 자신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자기에게 책에 밑줄을 그어 주던 일이 생각나더라고.
누구나 한 순간을 참지 못하고 실수 하는 건데 한 번 더 조금만 더 생각하면 무사히 지나갈 일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에서도 그렇다. 조금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살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마음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럴수록 적당한 운동이나 오락, 또는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즈음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우울한 분위기에 싸인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일수록 적당히 스트레스를 풀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까 보다.
스믈 여덟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윤동주. 별헤는 밤과 함께 윤동주 시의 압권을 이루는 서시는 생활 속에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는 짧은 나이에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이 서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강열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특히 때 묻지 않은 젊은 날에 쓴 시어들이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별과 죽음의 연관된 시어가 그렇고 바람에 스치우는 별이 그렇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큰곰자리 키시오페아 북극성 등을 보고 저별이 내 것이고 저 것은 네 것이고 하면서 별을 하나씩 나눠가진 적이 있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언제든 욕심껏 갖고도 괜찮은 것은 저 밤하늘의 별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보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별이 너무 사랑스럽다. 얼마 전에는 잔디밭에 몽땅 쏟아질 것 같이 떠 있는 별을 보고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나 저 별 하나 가지면 안될까? 물론 나는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별들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고 마음껏 별들을 담아보라고. 그러면서 나도 팔을 벌려 수 많은 별들을 가슴에 담아 보았다. 참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그 별들을 내놓으라는 사람이 없다. 별아 내 가슴에(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