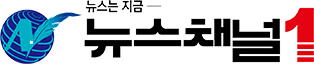창가의 난초는 하늘거리고
가지와 잎 향그럽더니
가을바람 잎새에 한 번 스치고 가자
슬프게도 찬 서리에 다 시들었네
빼어난 그 모습은 어울어져도
맑은 향기만은 끝내 죽지 않아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져
눈물이 흘러 옷소매를 적시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이 때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다. 불과 기백 년 전의 일이다. 그나마 이름이 있었던 것은 기생들이었다. 그것도 노리갯감으로 불리기 위해서 붙여졌던 이름이대부분이다. 하긴 내가 여렸을 때만해도 우리 동네 여자들 이름이 끝순이(여자형제중 제일 끝에 났다고),말순이,언년이,간난이,큰년이 등의 이름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집안의 족보에는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았다. 생각해보니 일생동안 살면서 이름 하나 어디에 써 놓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여자였다. 어디 그 뿐이야 지독한 유교사상으로 인해서 여자는 삼종지도(三從之道)를 따라야 했고 칠거지악(七去之惡-여자를 내쫒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 때문에 평생을 남자에게 매어 지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데 이렇게 엄한 비인간적인 시대에 살면서 이름은 물론 자와 호까지 지니고 살던 여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글신동이라 불리우던 허초희, 허난설헌이다. 이 어찌 대단하지 않다 할 수 있으리오.(우리나라는 한일 합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 이름이 호적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때 여자들 이름의 대부분은 일본식 한자를 따서 미자,화자,순자,성자,정자,수자,말자,용자,추자,희자,숙자,문자,윤자 등의 자자 내지는 숙,희 등을 주로 사용했다.)
허초희, 그는 초희라는 이름 말고 경번이란 자를 가졌고 난설헌이란 호로 불리어 그를 허난설헌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알아듣는다. 보통의 여자들이 평범하게 그냥 살다 죽어간 것과는 달리 그는 겨우 스믈 일곱 해를 살다 갔으면서도 힘들고 괴로웠던 자신의 삶과 사랑과 정한의 눈물과 갈등을 표현한 수백편의 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정한의 눈물로 얼룩지게 만든 것은 그의 남편 김성립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그는 아주 못생겼으나 5대에 걸쳐 계속 문과에 급제한 안동김씨 아버지 김첨과 허초희의 아버지 허봉이 호당의 동창이었기에 이들끼리 혼담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아마도 정석대로였다면 허초희와 김성집은 부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김성집은 얼굴이 못생겼고 방탕성이 있었다 한다. 따라서 자기 보다 명석허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허초희에게 늘 자존감이 상해서 공부한답시고 밖으로 돌았
다는 것이다. 그런 남편을 생각한 허초희는 시를 지어 보냈는데 그 당시 사회분위기는 그것 조차도 흉을 보는 시대였다고 한다. 허초희가 27세의 아까운 나이로 죽을 무렵 경상감사로 내려갔던 아버지 초당은 서울로 오던 중 상주객관에서 객사하고 둘째오빠 하곡은 율곡과 당파싸움 끝에 갑산으로 귀양 갔다. 귀양이 풀렸어도 한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금강산을 떠돌다 객사하고 그 뒤 허초희의 아들과 딸도 병으로 죽고 나중엔 뱃속의 아기까지 잘 못되어 난설헌의 슬픔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파란 만장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는 틈틈이 마음을 달래는 시를 썼으니 그게 바로 난설헌집에 수록된 211편의 시이다. 난설헌은 죽으면서 그의 시를 모두 불태워버렸으나 살아생전 틈틈이 허균이 옮겨 써 놓고 기억해 써 놓은 것이 바로 난설헌집이다. 난설헌의 시는 중국에서도 책으로 나와 전해지고 있다. 1607년 공주목사로 가게 된 허균은 1608년 4월 허난설헌집을 목판본으로 만들었는데 이 때 오명제란 명나라 시인에게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다. 오명제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허난설헌집을 발간하였다.(허난설헌시집머리글에서일부인용) 지금도 공주 어딘가에는 허난설헌 목판본이 숨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공주시 전체를 찾아서 허난설헌 목판본이 나오길 기도해 본다.
자신의 당호를 난설헌이라 지을 때 난초에서 난자를 따와 난초 내 모습이라 지은 이 시는 허난설헌 인생의 한 부분을 연상하게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결코 평범하지 못했던 집안과 집안의 흥망 내력 자신의 괴롭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혼자 외롭게 버텨야 했던 순간들, 그 순간순간들과 난초가 처한 환경, 그걸 이겨나가는 난초의 생명력, 어쩌면 허난설헌이 여자로서 여리고 약한 모습, 그러나 심지가 곧고 고결한 품위와 향기를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 시를 읽으면 마음이 아파 온다.
그러면서 고결한 난의 향기는 난설헌의 인품이 높음을 연상시킨다. 그는 아버지와 작은 오빠, 두아이와 뱃속아기까지 보내고 모든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닦으며 슬퍼하다가 급기야는 스믈일곱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비록 스믈 일곱의 나이로 일찍 갔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남긴 211편의 시는 오래오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같이 아파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당대의 최고 여류시인 허난설헌을 기억할 것이다.(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