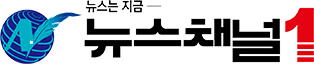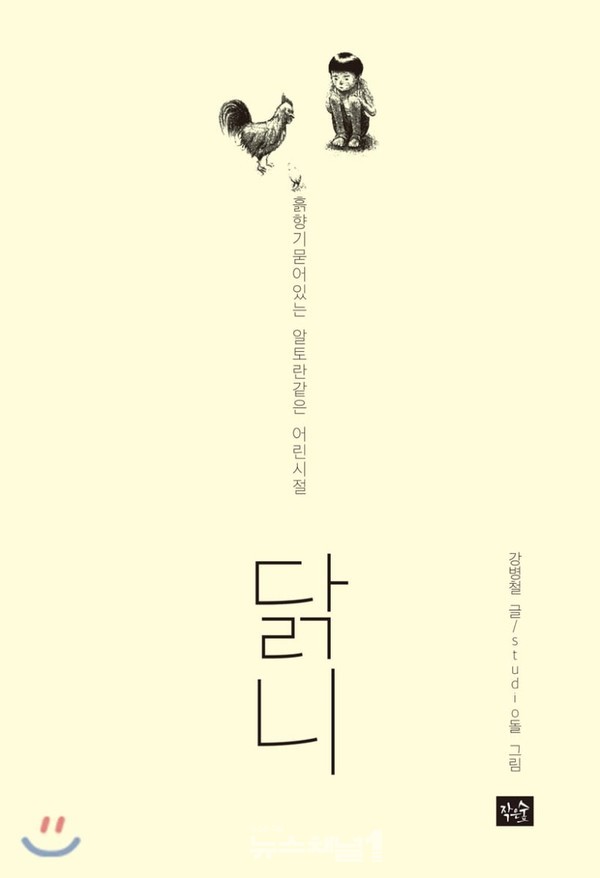
아파트 숲 속에서 흙 밟을 기회가 없이 성장하는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흙 향기 묻어 있는 알토란 같은 어린 시절 이야기.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된 적이 있지만 평생,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아온 작가가 같은 이름의 동화를 17년 만에 복간했다. "이차구차 사연으로 절판"된 책이었지만 작가는 닭니(닭에 몸에 기생하는 가려운 이) 같이 "도깨비밥풀처럼 달라붙던 유년의 사연"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젠 어느덧 손자뻘이 된 젊은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흙 냄새, 비릿한 갯벌 냄새를 맡으며 순박한 정서를 기르던 그때 그 시절. 쥐꼬리 자르기, 풀빵, 아이스케키, 닭니 등 재미나면서도 가슴 찡한 이야기들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해 동네 침방에서 삼십 원짜리 침을 맞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결국 초록빛 바다가 된 옥이 이모.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녹아 내리는 아이스케키를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었던 두 모녀. 어미 닭에 쫓겨 노란털이 핏빛으로 물들어 가는 병아리를 구하려다 닭니가 옮아 머리를 빡빡 깎을 수밖에 없었던 강철이. 때론 가슴을 저리게 하다가, 때론 풋풋한 미소를 자아내게도 하는, 잊혀져 간 것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낸 이 책을 추천사를 쓴 도종환 시인은 토속적이고, 눈물겹고, 정겨운 아름다움이 있는 책이라고 극찬했다.
작가의 말
적돌만 가는 길목 마당에 밀짚방석 깔아놓은 여름밤이다. 저물녘마다 누나들이 우리 집 마당을 가로질러 바다로 나갔다. 도회지 사람들처럼 별들의 그물망으로 넘실거리는 밤바다 풍경 만나는 줄만 알았다. “워디 간댜?” “후후후…… 바다 귀경.” 밤이슬 맞으며 소금 긁으러 가는 줄 안 건 훗날의 얘기이다. 저수지처럼 가두어 염분을 증발시킨 농도 진한 바닷물을 염전에 담아놓고 여름 땡볕으로 하염없이 말리는 고단한 도정이다. 마침내 바닥으로 소금기 깔리면 고무래로 버석버석 긁어 창고에 나르는 것이다. 짚누리 뒤에서 오줌을 누다가 마주친 누나들은 소금꽃 종아리 털어내며 박꽃처럼 푸짐한 웃음을 지어주곤 했다. 모든 마을마다 바다가 옆구리처럼 달려있는 줄 알았던 유년의 사연이다. (중략)
추천평
강병철의 『닭니』는 토속적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 한머리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바닷가로 농게와 능쟁이를 잡으로 가기도 하고, 울면서 할머니를 부르며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눈물겨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초록바다가 된 이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풀빵을 팔고 아이스케키를 팔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연화의 모진 인생살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정겨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넘치고, 배를 곯아도 흙 묻은 손으로 잡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책은 드러내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흙 향기 묻어 있는 알토란 같은 이야기를 써 놓고도 자랑하거나 떠벌이지 않고 장승처럼 서서 벙긋이 웃는 작가 강병철의 질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정적인 문체에 감겨 더욱 애잔하고 풍요로운 이 이야기를 단숨에 읽고 난 뒤 아직까진 나는 ‘슬픔에 더 단단해지는 조약돌이 되고 싶어’ 하던 강철이의 첫사랑 연화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도종환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