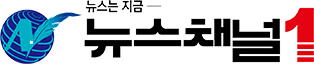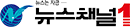인간 전병철(작가)
어쩌면 ‘산제당’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산제당'이란 이름을 알지 못하였으며, 산신제를 지내는 ‘산제당’이 마을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다. ‘계룡산 산신제’와 같은 대대적인 행사 외에 마을에서도 산신제를 지낸다는 이야기 들어보긴 하였으나, 막상 산신제를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고 살았다. 2023년 공주지역에 있는 사당이나 재실‧제실‧제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제당’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도 적잖은 마을마다 산제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호랑이를 산신처럼 여기고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사찰에 있어 전통 신앙으로 산신 숭배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마을마다 산제당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민간에 산신 신앙이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인지 욕심이 생겼다. 현재 남아 있는 산제당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찌 관리되고 있는지 등등 공주시에 있는 산제당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사할 수 없었다. 아니 조사하기 어려웠다. 산제당은 보통 산속에 있어 눈에 띄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알아도 풀과 나무로 뒤덮여 길 보이지 않아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 산제당을 찾아도 문을 잠가놓은 상태라 외부만 볼 수 있지 내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동네 이장이나 마을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산제당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공주시 산제당 조사를 위해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혼자 힘으로는 겨우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조사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여 공주시에 있는 마을 모두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인터넷이나 문헌에 ‘산제당’이나 ‘산신제’가 한 번이라도 나온 곳을 우선으로 조사하였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전에는 이보다 많은 산제당이 있었을 것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가운데 과학의 발달은 물론 미신이라거나 유일신 보급 등으로 세상이 변하면서 산신이나 제사의 의미가 줄어들고 적잖은 산제당이 사라졌을 것이다. 또 확인하지 못한 산제당도 있을 터이지만, 현재 공주시에 남아 있는 산제당(제단 포함)으로 확인된 것은 공주 시내권[동(洞)]에 4개, 계룡면에 2개, 반포면에 3개, 사곡면에 10개, 신풍면에 7개, 우성면에 2개, 유구읍에 9개, 의당면에 0개, 이인면에 2개, 정안면에 7개, 탄천면에 1개, 이렇게 총 47개가 있었다.
계룡산 천황봉은 행정구역상 공주시가 아닌 계룡시에 해당하지만, 그 자락 등이 공주시에 포함되어 있어 공주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계룡산 천황봉에 세워져 있는 산제단까지 합하면 전체 48개나 되는 산제당이 있었다.

현재 공주시 행정구역은 6개 행정동(行政洞: 금학동‧신관동‧옥룡동‧웅진동‧월송동‧중학동)이 27개 법정동(法定洞: 금학동 6, 신관동 3, 옥룡동 4, 웅진동 4, 월송동 6중학동 4)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 1개 읍(유구읍)과 9개 면(계룡면‧반포면‧사곡면‧신풍면‧우성면‧의당면‧이인면‧정안면‧탄천면)에서 161개 법정리(法定里: 계룡면 17, 반포면 8, 사곡면 13, 신풍면 14, 우성면 23, 유구읍 18, 의당면 12, 이인면 17, 정안면 22, 탄천면 17 *1리‧2리∽7리까지 구별하면 249개 법정리)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공주시는 총 188개 법정동‧리(法定洞‧里)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공주시 188개(1리‧7리 구별 276개) 법정동‧리에 47개 산제단이 있으니 약 25%에 해당하는 마을에 산제당이 있는 편이다. 평균 4개 마을 가운데 1개 마을에 산제당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산제당이 없는 마을이 훨씬 더 많았고 반대로 한 마을에 여러 개 있는 마을도 있었으며, 또 여러 마을이 하나의 산제당에서 함께 산신제를 지내는 곳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공주시에 전해지는 사당‧재실이 공주시 남쪽 지역(계룡‧반포‧이인‧탄천)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산제당은 북쪽 지역(사곡‧신풍‧유구‧정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우성과 의당지역 또한 사당‧재실이 많았던 것과 달리 산제당은 아주 적게 분포하였다. 이런 까닭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북쪽에는 무성산(茂盛山, 614m)과 태화산(泰華山, 417m), 광덕산(廣德山, 699m, 정안면)을 비롯하여 국사봉(國士峰, 403m, 정안면), 국사봉(國司峰, 349m, 정안면), 국사봉(國師峰, 592m, 사곡면), 국사봉(國師峰, 489m, 신풍면), 옥녀봉(玉女峯, 362m, 신풍면), 구절산(九節山, 355m, 신풍면), 금계산(金鷄山, 575m, 유구읍), 법화산(法華山, 471m), 광덕산(廣德山, 317m, 신풍면), 철승산(鐵繩山, 411m, 사곡면) 등 비교적 높은 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 호랑이로부터 피해 또한 적지 않아 호환(虎患)을 입지 않으려 산신제를 지내는 민간신앙이 널리 퍼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남쪽에는 계룡산(鷄龍山, 845m)을 비롯하여 국사봉(國賜峰, 392m, 반포면), 건지산(乾芝山, 237m, 이인면), 운암산(雲岩山, 292m) 등 크고 작은 산이 있으나 계룡산 산신의 위치(지위)가 워낙 막강하고 동학사나 갑사‧신원사를 중심으로 산신제를 지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마을 산신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교통마저 편리한 개방적인 마을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신 신앙이 널리 자리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주지역에 남아 있는 47개 산제당 가운데 공주에서 널리 알려진 산을 중심으로 그 산과 관련된 산제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꼭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였거나 호랑이로부터의 피해가 있어 마을 산신제를 지내게 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중동은 호랑이가 살만한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내 중심에 있음에도 예전에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또 공주 시내 중심권에 있는 교동이나 산성동도 호랑이가 나올만한 산이 아닌 야산에 위치함에도 오래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왔다. 현재도 교동과 산성동은 교동계(敎洞契)와 산성동 대동계(大同契)를 중심으로 마을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데 교동 산제당은 교동초등학교 옆 산 중턱에 자리하고, 산성동 산제당은 공산성 동문(同門) 영동루(迎東樓)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 둘 다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졌다.

반대로 한 마을에 산제당이 여러 개 있는 마을도 있는데 사곡면 가교리와 운암리, 신풍면 쌍대리, 유구읍 구계리와 탑곡리, 정안면 고성리와 대산리, 월산리가 이에 해당하였다. 사곡면 가교리에는 가교1리와 가교2리에 각각 산제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가교2리 산제당은 없어지고 가교1리 산신당만 남아있으며 가교1리에서만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특히 가교1리 산신당은 위패가 ‘산신지위(山神之位)’와 ‘성황신위(城隍神位)’ 2개가 있어 산신 이외에 성황신을 모시고 있는 점도 특이하였다. 또 가교1리 산신당은 건물 구조가 제사 공간, 부엌 공간, 휴식 공간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산제당과는 남달랐다.

신풍면 쌍대리에는 짐대울마을과 토끼울마을에서 각각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공주 신풍면과 청양 대치면·정산면 등 칠갑산 북쪽 자락에는 많은 고개가 있어 이들 고개에서 산신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짐대울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물론 산제당도 없어지고 토끼울마을에서만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신풍면 쌍대리 토끼울 산제당에는 한 칸 규모의 제사 공간과 반 칸 규모의 부엌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제사 공간에는 제단과 그 위에 ‘산신지위(山神之位)’라는 위패가 세워져 있었다.

사곡면 운암리에는 운암1리와 운암2리에 각각 산제당이 있으며 현재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사곡면 운암1리 산제당은 마을 북쪽에 있는 구암소류지(九岩沼溜地 *소류지: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농경지에 공급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규모가 작은 저수지)의 동북쪽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나무로 지은 산제당이 있었으나, 오래되어 무너지는 바람에 2010년쯤 성금을 모아 양철지붕에 시멘트와 벽돌집으로 새로 지었다고 한다.

사곡면 운암2리 안터마을에서 서북쪽으로 펼쳐진 왕솔밭(마곡초등학교 뒤쪽 산)에 자리하고 있는 사곡면 운암리 운정 산제당은 원래 ‘오성골’에 있었는데 1936년에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기와지붕과 목재를 중심으로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운암리 운정 산제당은 현판에 ‘태화산당(泰華山堂)’이라고 쓰여 있었다. 대부분 산제당에는 현판에 ‘산제당(山祭堂)’ 이외에 ‘산신당(山神堂)’이나 ‘산신각(山神閣)’이라고 쓰여 있는 것과 달리 ‘태화산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특이하였다.
유구읍 구계리에서도 구계1리와 구계2리도 각각 산신제를 지냈다고 하나 현재 구계1리에서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산제당도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계2리에만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유구읍 구계2리는 ‘산이 막혔다’라는 뜻으로 ‘산막(山幕)’마을이라고도 불렀으며, 마을 뒷산 ‘산제당골’에 자리한 산제당 현판에는 '영산각(灵山閣)’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영산각(灵山閣)은 한자만 다를 뿐 '영산각(靈山閣)'과 같은 말이라 한다. 무엇보다 유구읍 구계리 산막 산제당은 기둥과 문은 물론 벽 자체를 모두 나무로만 지은 것으로 콘크리트는 물론 흙조차 사용하지 않은 색다른 건물이었다. 반포면 상신리 산신당도 나무기둥에 벽면과 천장(天障)은 물론 바닥, 문까지 모두 나무로 되어있어 남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붕은 둘 다 슬레이트 기와를 얹혔는데 유구읍 구계리 산막 산제당은 검정 기와에 양 끝을 치미로 장식하였고 반포면 상신리 산신당은 청색 기와에 중앙에 상투 모양을 장식하였다. 흔히 볼 수 있지 않은 색다른 건물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유구읍 탑곡리에서도 소릿골마을과 탑산마을에 각각 산제당이 있어 따로 산신제를 지냈는데 현재 탑곡리 탑산 산제당은 없어지고 탑곡리 소릿골마을만 마을 뒷산에 있는 산제당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탑곡리마을회관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탑산리 소릿골 산제당은 큰바위 바로 밑에 있는데 사각 나무기둥에 흙으로만 벽을 채우고 양철지붕을 얹은 단칸 건물이다. 붉은색 지붕과 연한 녹색 문, 노란 흙벽이 서로 어울리며 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눈에 띄었다. 이런 점은 사곡면 계실리 음촌 산제당도 마찬가지였는데 사곡면 계실리 음촌 산제당은 원래 기와집이었으나 1966년 슬레이트 지붕으로 새로 지었다 한다. 하지만 현재 양철지붕이며, 둥근 나무기둥에 벽과 바닥은 흙과 콘크리트로 되어있다. 하늘색 지붕과 노란색 문, 흰 벽이 서로 어울리며 예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1960‧7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과 함께 토속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건물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안면 고성리에서는 양달말(양지 마을)과 음달말(음지 마을)에 각각 산제당이 있어 산신제를 따로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고성리 양달말에서만 산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고성리 음달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정안면 고성리 양달말 마을 뒤쪽 산 아래 사방댐 근처에 있는 고성리 양달말 산제당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잘 지어져 있다. 산제당은 입구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정도로 길도 잘 나 있다. 반면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 고성리 음달말 산제당은 현재 남아 있기는 하나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

또 정안면 대산리에서도 재산1리 죽암마을과 대산2리 안소랭이마을에서 각각 산신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 대산1리 산제당은 없어진 상태며 대산2리에서만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정안면 월산리에도 고덕동 산신제와 중산동 산신제를 지냈다고 하며 특히 고덕동 산신제는 일본 기자들이 취재할 정도로 유명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고덕동과 중산동 산제당이 모두 없어진 상태며 산신제도 지내지 않는다. 다만 월산1리 병풍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이어오고 있다. 뒷산 ‘고염나무골’에 자리한 산제당에서는 2023년까지 산신제를 지내왔으나 마을 젊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산신제를 지내지 않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러 마을이 하나의 산제당에서 함께 산신제를 지내는 곳도 있었는데 우성면 한천리에 있는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부전동 뜸박 열두동네 산제당’이 그랬다. 부전동(浮田洞)은 무성산 남쪽에서부터 금강에 이르는 20여 리 정도의 긴 골짜기 지대로 총 15개의 자연마을을 아우르는 지역을 가리킨다. 우리 말로 ‘뜸바골’ 혹은 ‘뜬밭’ 등으로 불렀으며 오늘날 행정구역으로는 공주시 우성면의 한천리(韓川里)·내산리(內山里)·도천리(道川里)·신웅리(新熊里)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부전동 열두동네는 한천리(상‧중‧하), 내산리(안골‧경석골‧동석리‧중말), 도천리, 신웅리, 월미리, 영천리(2개 마을) 이렇게 12개 마을이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들 마을은 대략 1663년부터 부전대동계(浮田大同契)를 조직‧운영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동계를 중심으로 한천리 무성산 중턱에 있는 산신각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부전동 뜸박 열두동네 산신제’를 살펴볼 수 있는 동계좌목(洞稧座目), 부전동물유치책(浮田洞物留置册) 등 부전대동계(浮田大洞契) 관련 문서 23개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2013.04.22.)되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통 산제당은 단칸 건물로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있는 게 많다. 그러나 특별하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제사 공간) 이외에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 또는 준비실이나 보관실로 사용하는 공간(보조 공간)을 따로 마련한 곳이 있었다. 사곡면 가교1리 산신당, 신풍면 쌍대리 토끼울 산제당, 신풍면 화흥리 화양 산제당, 유구읍 연종리 연마루 산제당, 정안면 월산1리 산제당, 탄천면 국동리 산제당 등이 두 개 내지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제사 공간과 보조 공간 이렇게 2개 공간으로 지어졌으나 가교1리 산신당은 제사 공간과 부엌으로 사용하는 보조 공간 이외에 휴게실 같은 방이 더 있어 총 3개의 공간으로 되어있었다.
신풍면 화흥리 화양 산제당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원래 신당(神堂)이 따로 없이 태화산 활인봉(泰華山 活人峯) 정상 나무 앞에 제사상을 차려 산신제를 지내다가 나무가 부러져 돌기와로 신당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올라다니기가 힘들어 산 아래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현재 슬레이트 지붕에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로 정면에 문을 달고 전체 벽을 하얀색으로 칠해 깔끔하고 단아한 얼굴을 하고 있다. 산제당 건물 앞에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움막 같은 시설이 따로 있어 제사 공간과 보조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구읍 연종리 연마루 산제당은 마을 서쪽 태화산(泰華山) 줄기 산속 울창한 소나무 숲에 자리하고 있는데 기와지붕에 콘크리트 건물로 정면이 아닌 옆쪽에 문을 달고 전체 벽을 하얀색으로 칠해 신풍면 화흥리 화양 산제당처럼 깔끔하고 단아한 얼굴을 하고 있다. 옆으로 나있는 문을 열고 산제당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 있어 작은 공간과 큰 공간으로 나누어진 구조이다. 작은 공간은 보조 공간, 큰 공간은 제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안면 월산1리 평풍(병풍)마을 ‘고염나물골’에 자리하고 있는 월산1리 산제당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두 칸 건물로 원래 좀 더 높은 곳에 있었으나 불편하여 현재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탄천면 국동리 마을 맨 위에 자리하고 있는 국동리 산제당은 원래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으나 올라다니기가 쉽지 않아 아래쪽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국동리 산제당은 컨테이너에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얹은 두 칸 건물로, 한 칸은 제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 칸은 음식을 조리하는 아궁이와 나무,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 건물 밖으로 굴뚝을 내놓고 있었다.
특별한 형태로 지어진 산제당도 있었다. 유구읍 유구리 창말 산제당과 유구읍 세동리 상세동 산제당이 특히 그랬다. 유구리 창말마을 뒷산에 있는 산제당은 대부분의 산제당 건물이 사각형 구조인 것과 달리 육각형 구조를 하고 있어 특이하였다. 둥근 나무기둥에 콘크리트로 벽을 채우고 문과 지붕을 양철로 마감하면서 지붕 중앙에는 상투를 올려 남다른 멋을 품고 있었다. 이 같은 건물은 흔하지 않은 만큼 널리 알려져도 좋지 않을까 싶다.

유구읍 세동리 상세동마을 뒷산에 있는 전통 한옥 양식의 산신각은 일반적으로 산제당 건물이 단칸인 것과 달리 가로 2칸 세로 1칸 반 이렇게 총 3칸 건물에 마루가 있고 문이 2개인 것은 물론 마루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공간은 하나로 된 구조라 특이하였다. 여기에 같은 산신도가 2개 걸려있어 또 특이하였다. 원래는 내부가 둘로 나뉘어 있었으나 하나의 공간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궁금하였다.
지붕 중앙에 상투 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는 산제당이 적잖게 있었다. 정안면 쌍달리 산제당처럼 지붕 중앙에 상투 모양의 장신을 한 지붕은 주로 양철지붕에 많았는데 유구읍 동해리 산제당과 같이 기와지붕에 상투 모양을 장식한 산제당도 있었다. 정안면 쌍달리 마을 뒤쪽 무성산(茂盛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쌍달리 산제당은 네모진 나무기둥에 흙으로 벽을 쌓아 건립한 정사각형 단칸 집이다. 출입문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여는 여닫이로 하였으며 양철지붕에 지붕 한가운데에 상투 모양을 올려 아담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고 있다.

유구읍 동해리 산제당은 원래 마을 뒤쪽 태화산(泰華山) 기슭 7부 능선에 있는 바위 앞 평평하게 다져 놓은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마을이 점점 커지면서 산제당을 짓고 두 차례나 옮기는 과정을 거쳐 1985년 현재의 위치인 마을 앞 ‘도깨비바위’ 옆에 자리하였다고 한다. 콘크리트 단칸 건물로 기와지붕에 지붕 중앙에 상투 모양의 장식을 하고 있으며 하얀색으로 색칠을 하여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아하면서 고고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동해리에서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산신제를 지금도 엄격하게 이어오고 있어 산제당 주변에 새끼줄을 두르고 부락민은 물론 외부인 출입을 금하며, 산신제 기간에 제관(祭官) 3명, 공양주 1명 등 4명만 들어갈 수 있고 여성은 출입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태화산 산왕대신(山王大神) 산신제’를 지낼 때 지금도 800kg이 넘는 황소를 잡아 제사를 지내 그 규모가 보기 드물 정도라 한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한 원인을 제공한 탐관오리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이 동해리 선학동에서 은신 생활을 할 때 이곳 산신제 축문을 읽은 기록이 동해동산제계좌목(東海洞山祭稧座目)에 전해지기도 한다.
산제당 내부나 외부가 특별한 곳이 있었다. 사곡면 부곡리 산제당과 신풍면 산정리 산제당이 특이하였는데 사곡면 부곡리 산제당은 산제당 건물 안에 산신도나 위패가 없는 것은 물론 제단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자연상태의 넓적하고 큰 바위를 모시고 있었다. 사곡면 부곡리 산제당은 원래 마을 뒤 태화산(泰華山) 자락 중턱에 있었으나, 어느 날 제기(祭器)가 없어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서서 찾아보니 마을 앞 개울 건너 국사봉 자락 아래쪽에 있는 바위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는 ‘산신령의 뜻’이라 여겨 현재 있는 곳으로 산제당을 옮기면서 바위를 제단으로 삼아 산제당을 세웠다고 한다.

바닥이 땅 위에 떠 있거나 맨땅을 바닥으로 한 산제당도 있었다, 유구읍 덕곡리 당골 산제당은 구당골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제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나무문에 벽과 지붕은 모두 양철로 마감하고 바닥은 간단하게 나무와 장판으로 처리하여 건물 자체가 땅으로부터 약간 떠 있는 형태로 되어있었다.

또 유구읍 신달1리 마을 뒷산 중턱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유구읍 신달리 산제당은 맨땅바닥에 나무기둥을 세우고 정면은 양쪽으로 여닫는 나무문에 나무로만 벽을 채우고 나머지 벽은 흙으로 채운 건물로 지붕은 양철로 덮었다. 그러나 흙벽 일부에 구멍이 생겨 밖에서 양철로 덧대어 놓고 있어 한편으론 양철집 같은 분위기가 나기도 하였다. 대부분 산제당이 바닥을 땅바닥 위에 나름 마감한 것과는 달리 맨땅을 그대로 바닥으로 사용한 것이나 농막처럼 땅 위로 떠 있는 게 특이하였다.
산제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달려 있지 않은 산제당도 있었다. 유구읍 문금리 문암 산제당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작은 크기의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고 지붕과 벽 사이가 일부가 뚫려있어 특이하였다. 하지만 산제당 앞쪽으로 대형 건물이 들어서고 울타리가 생기는 바람에 산제당으로 가는 길이 막혀 유구읍 문금리 산신제는 사정에 따라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에서 지내는 거리제와 함께 지내기도 한다고 한다.

신풍면 산정1리 마을 뒷산 꼭대기에 있는 산제당은 벽돌과 콘크리트에 플라스틱 기와로 지어졌는데 산제당 건물 앞 옆쪽에 직사각형 모양의 평평한 의자처럼 만들어놓은 단(壇) 같은 것이 있다. 이 단 같은 시설은 어떤 용도로 만든 것인지 궁금하였지만, 산제당 문도 닫혀 있고 주변에 물어볼 마땅한 이를 찾지 못해 파악하지 못하였다.
현재 산제당은 남아 있지만, 산신제를 지내지 않아 산제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 정안면 고성리 음달말 산제당과 정안면 보물리 산제당이 그랬는데, 정안면 고성리 음달말에서는 현재 아예 산신제를 지내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안면 보물리에서는 산제당 대신 마을 안쪽 보호수로 지정된 괴목(槐木) 앞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정안면 보물리에서는 원래 마을 뒷산 중턱에 산제당 건물이 있어 얼마 전까지는 그곳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산제당으로 올라가는 길이 좋지 않고 마을에 젊은이가 점점 줄어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안 보호수(保護樹)로 지정된 느티나무에서 둥구나무제와 산신제를 한 번에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둥구나무는 크고 오래된 정자나무를 가리키며, 정자나무는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로 그 그늘 밑에서 놀거나 쉴 수 있는 정자(亭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를 가리킨다.
한편 산제당 건물이 따로 없이 공터나 바위, 장승, 나무 등을 산제당으로 여기며 특별한 곳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도 여럿 있었다. 또 산제당 건물이 있으나 이곳은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주변에 재단을 따로 마련하여 산신제를 올리는 마을도 있었다. 이런 마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주시 소학동, 계룡면 금대리 황새울마을, 신풍면 동원리 동막마을과 신풍면 입동리에서는 산제당 건물이 따로 없이 바위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공주시 소학동 마을회관 앞으로 보이는 산(‘시학섬마을’ 뒷산)을 오르다 보면 중간쯤에 바위들이 여럿 있는데 넓고 평평한 바위를 제단 삼아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그리고 계룡면 금대리 황새울마을에서는 원래 불탄봉(검바위산) 꼭대기에서 산신제를 지냈으나 산 정상까지 올라다니기가 번거롭고 여기에 마을에 젊은이가 줄어드는 등 여러 사정으로 산꼭대기에 있는 산신을 산 아래 평지로 모셔오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장기정씨(長鬐鄭氏) 재실(齋室) 봉서재(鳳棲齋) 옆 개울 건너근처에 있는 바위에서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신풍면 동원리 동막마을은 산제당이 원래 마을 뒤쪽 ‘불당골’ 백운산 중턱에 있었으나 없어져 산제당이 있던 위쪽 바위에서 마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그리고 산제당이 있던 자리에는 태화사(옛 백운암, 대명사) 산신각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마을 제사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사정 등으로 마을 공동으로 치르는 산신제는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현재 산신제는 태화사에서 주관하여 지내며, 이때 마을 사람 몇몇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신풍면 입동리 산신제는 구절산 구룡사(九龍寺) 구절암(九節庵) 산신각에서 사찰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냈으나, 요즘에는 마을 산신제는 마을 뒷산 바위(‘신선바위’ 또는 ‘돼지바위’)에서 구룡산 산신제는 구룡사 구절암 뒤 ‘산신령바위’에서 각각 지내고 있다. 다만 마을 ‘신선바위’와 구룡사 ‘산신령바위’ 이름이 비슷하고 돼지바위는 이미 구룡사 구절암 입구에 있는 만큼 혼동되지 않게 입동리 마을 신선바위를 ‘복바위’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반포면 봉곡리 금천마을에는 특이하게 장승이 두 곳에 있다. 마을 입구에도 장승이 있고 마을 안쪽 거문거리에도 장승이 세워져 있다. 금천마을에서는 산제당 건물이 따로 없이 마을 안 거문거리(정광터 서낭당이 있던 곳) 장승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그리고 거문거리 장승에서는 산신제를 마치고 이어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에서 거리제(장승제)를 지낸다.

산제당 건물이 있음에도 그곳에 제단을 설치하지 않고 창고나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옆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따로 마련하여 산신제를 지내는 곳도 있었다. 사곡면 해월리 산제당과 신풍면 선학리 산제당이 그랬다. 사곡면 해월리 산제당은 마을 뒤쪽 철승산 자락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콘크리트 단칸 건물이다. 다만, 이곳은 제기(祭器)나 조리 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제사는 산제당 및 큰 나무 옆 평평하게 다진 땅 위에 넓은 돌판으로 마련한 제단에서 지낸다.

마찬가지 팔봉산 보광사(普光寺)로 올라가는 길 중간쯤에 있는 신풍면 선학리 산제당도 산제당 건물은 있으나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산제당 및 큰 나무 옆 땅에 여러 개의 돌로 평평하게 만든 제단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마을 주민이 합심하여 마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마을 공동으로 지내지 않고 개인이 지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 사곡면 월가리 약산 산신제가 그리되었고 사곡면 회학리 산신제와 우성면 보흥리 수옥동 산신제도 그리 지내고 있었다. 우성면 화월리와 방문리의 경계를 이루는 약산(藥山) 아래쪽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사곡면 화월리 산제당은 바로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으나 마을 주민의 입장과 마을 사정이 바뀌어 지금은 주민 몇 명이 개인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성면 용봉리를 비롯하여 보흥리‧오동리‧죽당리에 걸쳐있는 사마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우성면 보흥리 수옥동 산제당도 예전에는 마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단양이씨 문중 주민 개인이 관리하며 개인적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사곡면 회학리에서도 예전에는 마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마을 주민 개인이 관리하며 산신제를 지내고 있었다. 다만 원래 산제당은 두 칸 건물로 ‘산신각’이라고 새긴 현판이 걸려있고 기와지붕을 한 건물이었는데 현재 산제당은 샌드위치 패널의 조립식 단칸 건물로 새로 지은 것이었다. 옛 산제당이 있던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산제당은 회학리 마을 서쪽 태화산(泰華山) 줄기의 산 아래 ‘산신당골’ 개울가에 세워져 있었다.

이인면 초봉리 선근마을 산제당은 컨테이너 건물을 임시 산제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선근마을 산제당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주변 나무가 부러지면서 산제당 건물까지 함께 무너져버렸다. 이에 원래 산제당이 있던 곳 아래쪽에 컨테이너 건물을 임시 산제당으로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옛 산제당은 두 칸 건물로 제사 공간과 보조 공간이 따로 있었으나 현재의 임시 산제당은 한 칸 건물이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산제당을 마련하고 싶으나 산 주인이 개인인 탓에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이렇게 현재 공주시에 남아 있는 산제당이나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곳은 대략 47개 정도로 파악되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산제당도 있을 것이다. 공주시에 남아 있는 산제당과 관련하여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는 우성면 한전리 부전동 뜸박 열두동네 산제당의 ‘부전대동계’ 관련 문서와 유구읍 세동리 ‘상세동 산신도’ 이렇게 2개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산제당 가운데에는 건축적인 면에서나 예술적인 측면 등에서 소홀하게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있길 바란다.
공주시에서는 현재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에 많지 않아도 일정 부분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제당이나 산신제를 비롯한 민속신앙이 미신이라고 무시하거나 푸대접받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이리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본다.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려면 나름 큰돈이 드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많은 지원이 있길 바란다.
한편 기록이나 각종 자료에 마을에 산제당‧산제단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없어졌거나 산신제를 지내지 않고 있는 마을로 파악된 곳은 다음과 같다.

확인된 것만으로 25개 정도 된다. 아마 더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 부족과 산제당이 있는 곳을 몰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산제당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산제당 조사를 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은 게 있다면 ‘앞으로가 걱정’이라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마을에 젊은이가 없고 산제사(산신제)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지금은 그나마 마을 어른들을 중심으로 산신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어갈 사람이 없어 걱정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산제당이 있고 마을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냈을 것이나,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 다른 농촌 해체를 비롯하여 과학의 발달과 미신 타파 및 유일신 보급 확대 등으로 세상이 변하는 가운데 산신이나 제사의 의미가 줄어들면서 적잖은 산제당이 사라졌다. 세상이 변했으니 산제당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으나, 산제당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역사문화유산이나 전통 신앙, 우리 민족의 풍속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산제당이 점점 사라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한다. 막상 과거를 잊어버렸다고 하여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니고, 때론 과거를 잊어야 오히려 미래가 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알 수 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면 앞으로 어찌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하여 과거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모르면 당하기 쉽고, 모르면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않고 오늘날로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 산제당이나 산신제 또한 잊지 않고 오늘날 산제당과 산신제로 되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미련과 추억이 그립기도 한 오늘날 산신을 종교적인 신으로 보지 않고 우리 조상이 모시던 민속 상징으로 볼 수는 없을까, 산신제를 종교행사로 보지 않고 우리 민족 역사문화유산이나 고유 풍속으로 볼 수는 없을까?
[추신] 지면 관계상 <공주시 마을 산제당‧산신당‧산신각‧산제각∙산령각∙산제단 현황> 목록은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에 따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산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연락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주시 산제당 정리(4) 산제당 속에 감춰져 있는 역사문화유산 산신도(山神圖)>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