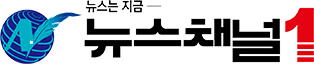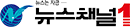인간 전병철(작가)
절(사찰)에 가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건물이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大雄殿)이나 비로자나불을 모신 비로전(毗盧殿, 대적전‧화엄전), 아미타불을 모신 아미타전(阿彌陀殿, 극락전‧무량수전)이다. 절에 따라 미륵불을 모신 미륵전(彌勒殿, 용화전‧장육전‧각황전),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藥師殿)이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이들 주변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觀音殿)과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地藏殿, 명부전‧시왕전‧영원전)이 있으며, 또 아라한(阿羅漢)을 모신 나한전(羅漢殿)이나 역대 조사(祖師)를 모신 조사전(祖師殿)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불교가 우리 전통 신앙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각(三聖閣)이나 산신각(山神閣)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삼성각이나 산신각은 대체로 사찰 한쪽 구석에 작은 건물로 세워져 있는데,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에 있는 신원사(新元寺) 산신각은 다른 곳과는 달리 규모도 클 뿐만이 아니라 이름도 특별하게 ‘중악단(中嶽壇)’이다. 보물로 지정된 중악단은 계룡산 산신께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 있는 건물로 ‘중악전(中嶽殿)’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서 해마다 4‧5월(음력 3월 16일 전후)에 ‘계룡산 산신제’가 열리고 있다. 계룡산 산신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제사를 지내왔는데, 지금은 유교, 불교, 무속이 혼합된 형태로 대규모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삼성각은 산신(山神), 칠성(七星), 독성(獨聖) 이렇게 세 분[삼성(三聖)]을 모신 건물이다. 여기에서 산신은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 칠성은 북두칠성(北斗七星)으로서 비 또는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다스리는 신을 가리키고, 독성은 홀로 깨달아서 성인(聖人)의 위치에 오른 이를 말한다.
불교의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홀로 깨달아서 성인의 위치에 오른 독성은 말세(末世)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며, 별나라의 주군(主君)인 북두칠성은 인간의 복과 수명을 주관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독성은 나반존자(那畔尊者, 빈두로존자)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나반존자는 석가모니의 제자인 16나한(羅漢, 아라한) 가운데 제 1존자(尊者)로, 남인도 천태산에서 수행하며 홀로 깨달아 성자(聖者)가 되어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일을 꿰뚫어 아는 것은 물론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神)인 산신은 흔히 산신령(山神靈)이라고 부른다. 산신령은 대개 백발에 긴 수염을 가지고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산신령이 꼭 할아버지 모습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할머니나 아줌마, 부부 산신령도 있고, 흰옷이 아닌 다른 색의 옷을 입은 산신령도 있다.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동학사(東鶴寺) 삼성각의 산신령을 눈여겨 살펴보면 산신도(山神圖, 산신을 그린 탱화)에 보이는 산신령은 남성이지만, 산신도 바로 앞에 있는 조각 산신상(山神像)에서 호랑이와 함께 있는 산신령은 여성이다. 산신은 원래 여성이었는데 유교 영향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대체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관심을 기울여 찾아보면 알려진 산신도 가운데 산신령이 여성으로 그려진 산신도도 적잖게 있다.

산신각은 산신만 따로 모신 건물이다. 삼성(三聖) 가운데 산신만 따로 모신 것을 보면 그만큼 산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산악에 대한 숭배와 함께 호랑이와 산신령을 산신으로 섬겨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역사의 첫머리인 단군신화에도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神壇樹)와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산신에 대한 민간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내려오고 있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 종교인 불교가 이 땅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런 민간신앙을 수용하였다. 사찰에서는 불교와 관계없는 산신을 모시고자 사찰 한쪽에 산신각이나 삼성각 등을 마련하여 전통 신앙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신앙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산신 신앙이 마치 불교 신앙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찰에 있는 산신각은 알아도 마을에 산제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심지어 산제당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제대로 알아보면 사찰에 있는 산신각보다 마을에 있는 산제당이 먼저인데도 말이다.

예산 덕숭산 수덕사(修德寺)와 함께 충청남도 조계종 사찰을 대표하는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 마곡사(麻谷寺)에는 국사당(國師堂)이라고 하여 역대 훌륭한 스님들의 영정을 모신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곳을 산신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마곡사에 속한 암자인 북가섭암(北迦葉庵)에는 산신각 건물이 따로 있고, 산신각 안 산신도와 함께 외부벽면 양쪽에도 산신령과 호랑이가 그려져 있다. 작은 암자에 이렇게 산신과 관련된 것이 특별하게 있는 것만 봐도 전통적인 산신 신앙이 불교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산신각은 절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동네마다 호랑이와 산신령을 모시는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흔히 산제당(山祭堂)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마을에 따라 산신당(山神堂)이라거나 산신각(山神閣), 산제각(山祭閣), 산령각(山靈閣)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산제당은 산신을 모신 집인 산신당에서 제[祭, 제사(祭祀)]를 지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산령각은 산신의 다른 이름인 산신령(山神靈)을 모신 집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제당은 보통 마을 뒤쪽 산 중턱이나 산기슭에 집을 지어 이곳에 산신을 모셔 제사를 지내는 마을 제당(祭堂)이다. 하지만 산제당이 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 평지에 산신을 모신 곳도 있으며, 산신을 모시는 집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특별한 곳에 평평하게 단(壇)을 쌓아 이곳에서 산신에게 제사 지내는 산제단(山祭壇)도 있다. 이런 산제당과 산제단은 산신을 섬기는 곳이자 마을의 수호신이 머무는 곳이었다. 해마다 마을에서는 정한 날짜(주로 봄과 가을인 음력 정월인 1월 초나 보름 및 10월, 간혹 12월)에 산제당에 올라가 산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다. 이렇게 산제당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마을 사람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서양은 하늘신(神) 하나만을 인정하는 유일신(唯一神)을 섬기고, 동양은 하늘은 물론 땅과 온갖 만물의 신을 인정하는 다신교(多神敎)적인 경향이 많았다. 서양도 고대 이전에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를 비롯한 올림포스 12신을 비롯하여 그 외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말이다.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개념이나 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고 신을 대하는 문화가 달랐다. 동양 문화권의 우리나라는 유일신이 아닌 다양한 신(神)[정령(精靈)]을 섬겼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을을 사람이 사는 곳만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우주로 보았다. 나아가 마을은 사람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신령(神靈)들도 함께 사는 공간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각종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짐승 특히 호랑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는 염원으로 초자연적인 신령(神靈)에 의지하여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특히 초자연적인 신령 가운데 마을의 주산(主山)에 산신[산신령(山神靈), 호랑이에 해당하는 정령]을 모시고, 마을 입구에는 장승, 돌무지, 선돌, 솟대 등을 세우고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시기도 하였으며 괴목(槐木) 등 오래된 나무를 서낭신으로 섬기기도 하였다. 이들을 섬기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마을에 있는 여러 신 가운데 산신은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기에 사람들에게는 산신은 어려운 존재였다. 산신은 마을의 최고신답게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마을 뒷산 중턱(혹은 산꼭대기)에 자리하였다. 이곳은 산신이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나, 반대로 마을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더구나 산신이 머무는 장소인 산제당은 기묘(奇妙)하게 가려져 있는 장소에 자리하였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일 년에 한두 번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만 산신을 뵐 수 있었다. 물론 정기적인 만남 외에 갑자기 생긴 마을 일로 특별히 산신을 찾아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 산신을 만나는 일은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산신을 찾아가려면 마을을 대표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뽑았다. 이들은 생기복덕(生氣福德: 그날의 운수를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과 천의(天意: 하늘의 뜻이나 기운)를 따져 선정하였는데 몸과 마음이 정갈하고 부정(不淨)이 없어야 하고 그해의 우주적인 기운과도 합치되어야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유사(有司: 제사 일을 맡아보는 이), 제관(祭官: 제사를 지내는 이), 축관(祝官: 축문을 읽는 이) 등 남성들로 구성된 제사 집행자만이 산제(山祭)[산제사(山祭祀), 산신제(山神祭)]를 모실 수 있었다. 이들 이외에 다른 사람은 산제당에 갈 수 없었으며, 여성들은 부정하다 하여 출입을 막았다. 제사 자체도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지냈다. 닭소리, 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시간에 지내야 했다. 더불어 제사를 치르는 동안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경건한 자세로 불을 환히 밝히고, 제사를 치르는 제관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처럼 산신제는 엄격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렀는데 이만큼 산신이 자치하는 위치가 자못 높았다.
또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을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공동체로써 하나의 마을은 한 분의 산신(山神)에 의하여 보호와 축복을 받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신성 구역으로 보았다. 몇 개의 마을이 한 분의 산신을 모신 경우가 없진 않지만, 대개 하나의 마을은 한 분의 산신을 모셨다. 그리고 각 마을의 산신은 다른 마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의 마을과만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마을마다 맺어진 한 분의 산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결속과 화합을 다지게 하는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하여 산신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확인하는 동시에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는 역할을 하는 민속신앙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다음에 <공주시 산제당 정리(3) 공주지역에 남아 있는 산제당(山祭堂)은 얼마나 될까?>로 이어집니다.